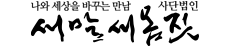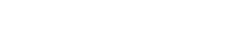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새문장 3기] 문제에서 존재로!(한강_채식주의자)
페이지 정보

본문
문제에서 존재로!
새문장 3기 이선영
햇살이 잔잔히 고이는 거실 창가. 잎을 비틀고 있던 화분 하나에 물을 천천히 부었다. 마른 흙이 물을 머금고 조용히 숨을 돌리는 순간, 누군가 떠올랐다. 나무가 되려 한 여자, 영혜.
몸을 먹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녀는 점차 스스로를 흙과 햇살 쪽으로 밀어 넣었다. 동물처럼 다른 생명을 먹고 생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빛을 머금고 고요히 존재하는 식물처럼 폭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살고자 했던 사람. 인간이라는 틀로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던 그녀는 침묵으로, 단식으로, 끝내는 몸 전체로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자 했다. 그건 어떤 절망이 아니라, 폭력의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가족들의 시선은 그 선택을 ‘의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 앞을 가로막은 이는 아버지였다. 고기를 거부하는 딸의 말 앞에서 그는 격노했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을 억지로 벌려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규범과 질서, 남성 중심의 위계였다. 영혜는 그 자리에서 침묵했고, 순응하지 않았다. 자신을 보호할 말이 허락되지 않은 자리에서 그녀는 말 대신 몸으로 저항했다. 손목을 그은 행위는 파괴이자 선언이었다. 폭력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몸만큼은 자신이 지키겠다는 조용한 절단.
남편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녀를 이상한 사람, 고장 난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변화한 그녀의 모습을 돌봄이나 공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상’이라는 관념으로 그녀를 고정하려 했고, 실패하자 버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영혜는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는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말을 접고, 식사를 거부하고, 점차 세계와 단절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낸다. 자기 의지를 ‘병’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는다. 오직 거부함으로써, 몸 전체로 저항하기 시작한다.
형부는 예술가로서 영혜에게 새로운 시선을 던진다. 그는 말없는 그녀의 몸에 매혹되고, 점차 인간적 정체성을 지워가며 식물적 존재로 이행하는 그녀의 상태를 ‘특이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그녀의 몽고반점—어린 시절부터 남아 있던 푸른 흔적—은 육체의 기원이자 신비로운 상징으로 보인다. 그는 그것을 작품으로 남기고, 꽃으로 덧그리며 예술로 승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영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 위에 투사된 자기 욕망의 이미지다. 침묵을 해석의 여백으로 착각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의 시선은 ‘이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실은 ‘소유’의 또 다른 방식이다. 말하지 않는 그녀를 자유로운 존재로 오인하며, 거부하지 않는 몸을 해석해도 괜찮은 캠퍼스로 받아들인다. 그는 그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이해한다는 명목 아래 끝없이 해석하고 소비한다. 그런 시선은 남편의 폭력적 억압보다 한 걸음 더 부드럽고 정교하지만, 결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낸다. 영혜는 그런 오독 앞에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이어간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더 이상 해석당하지 않겠다는 고요한 저항이다. 형부는 몽고반점을 통해 그녀의 깊이에 닿았다고 믿지만, 영혜는 이미 그 언어 바깥에서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저항은 점점 더 본질적인 방식으로 이어진다. 영혜는 스스로의 몸을 나무처럼 굳히며 살아가려 한다. 누군가는 이를 자기 파괴라 말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 안에서 생을 거머쥐려는 가장 근원적인 몸부림을 보았다. 규범의 언어로는 해석할 수 없는 저항, 단 하나의 존재로 남기 위한 깊고 단단한 고집.
그리고 끝내, 그녀 곁에 남은 사람은 언니였다. 인혜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점차 그녀를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말없이 곁에 있어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 절망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주저앉는 선택. 그것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유일한 응답이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서로를 껴안지도 않았다. 하지만 말이 없는 동행, 해석 없는 수용은 처음으로 영혜가 완전히 ‘문제’가 아닌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다. 그 장면은 묘하게 정적이고 깊었다. 앰뷸런스 안에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침묵은 어떤 울림을 품고 있었다. 전부 끝나버린 듯한 순간에, 아주 미세한 틈 하나가 열리는 것.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으려는 마음. 그건 회복보다 더 깊은 유대였다. 말보다 큰 제스처. 이해보다 깊은 수용.
영혜는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끝내 우리에게 질문을 남긴다.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는 없는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한 문장을 떠올린다.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세요. 그렇게 지금도 말하고 싶어요.”
-김장하의 인터뷰 일부-
그녀는 끝내 나무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내리려는 고요하고 완강한 몸짓은, 내 안에 작고 낯선 바람 하나를 일으킨다.
누군가를 고치려 하지 않고, 설명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옆에 있어주는 것
존재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를 갖는 것.
그건 말보다 큰,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
- 이전글[새문장 3기]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기(채식주의자-한강) 25.04.16
- 다음글[새문장 3기] 폭력과 자아상실(채식주의자-한강) 25.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