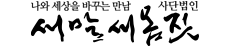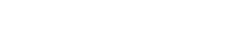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새문장 3기] 인간의 조건(채식주의자-한강)
페이지 정보

본문
인간의 조건 – 『채식주의자』를 읽고
어릴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 꼭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그런 증세가 나는 엄마의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채식주의자셨다. 어떻게 요리를 해도 고기 특유의 냄새를 귀신같이 감지하셨다. 그때 나는 엄마가 참 고집스러우시다고 생각했다. 10여 년 전 직장에서 채식을 하는 동료를 처음 만났다. ‘왜 고기를 먹지 않을까?’하는 가벼운 호기심은 있었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어쩌면 묻지 않음으로써 나와 다른 선택을 한 동료가 내 안에서 ‘유별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목구멍에 생명들이 걸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그녀는 채식을 선언했다. 단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녀의 결단은 일상을 흔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불편과 불안을 자극했다. 가족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정상’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어긋나는 그녀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었다. 남편은 그녀를 ‘순종적인 아내’의 틀에 가두려 했고, 아버지는 폭력을 통해 복종을 강요했다. 형부는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를 욕망의 대상으로 대상화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다움의 결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육식을 거부하고, 여성성을 거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도 거부했다.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종의 정체성까지도 거부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타인을, 나와 다른 존재를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환대할 수 있는가? ‘왜 그녀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는가?’라는 질문은 ‘인간은 타인의 다름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으로 옮겨간다.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나-너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타인을 ‘나-그것’으로 변환하며 이해 가능한 틀 안에 가두려 한다. 다름이 위협이 되고, 침묵은 불편이 되며, 자유의지는 반항으로 오인한다. 어쩌면 그녀는 나무가 되어야지만 인간의 폭력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인간이기를 멈춤으로써 오히려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되물어 보는 듯이.
엄마는 평생 육류를 드시지 않으셨다. 나처럼 육류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도 아니었고, 건강에 좋다는 말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엄마가 무슨 이념을 내세운 ‘주의자’이셨던 것도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육류 거부는 ‘그런가 보다’하고 받아들여졌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타인이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그리고 바꿀 수도 없는 엄마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었다. 직장에서 만난 채식하는 동료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선택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란 다름을 감수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려는 연습에서 비롯된다.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함께 밥을 먹고, 말을 걸고, 침묵을 존중하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환대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출발점이 아닐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_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정현종, 방문객)
타인을 공감과 이해의 대상이 아닌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관계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공감과 환대의 능력, 자기다움을 지키며 타자다움을 존중하는 힘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조건이 아닐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 이전글[새문장 3기] 폭력과 자아상실(채식주의자-한강) 25.04.16
- 다음글[새문장3기]보통의 왕국(채식주의자-한강) 25.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