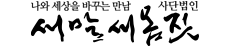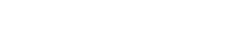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새문장2기] 신은 땅을 딛고, 둥근 것은 구른다(열하일기_연암박지원)_2
페이지 정보

본문
가슴속에 쌓인 탯덩이
하루는 연암이 그의 지인들을 불러놓고 열하일기를 낭독하는데 모여있던 무리 중 하나가 그의 문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리려고 하자 토라진 연암은 돌아누워 한동안 알은 채를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세를 정돈하고 그를 불러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산여’라는 자였다.
“산여야, 이 앞으로 오라, 내 이 세상에 불우한지 오랜지라, 문장을 빌려 불평을 토로해서 제멋대로 노니는 것이지, 내 어찌 이를 기뻐서 하겠느냐...(중략)”_[열하일기_이가원 역_올재_31쪽]
연암의 회심작 『열하일기』는 그 문장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조의 문체반정으로 인하여 금서로 지목된다. 명말청초 무렵 조선에선 개성이 강한 문체가 유행하였는데 문체반정은 이를 경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는 다시 ‘고문 古文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당시의 문학의 성장에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다른 때도 아닌 당의 통합과 문화 정치를 했다는 정조 시절이었음에도 연암 박지원에겐 시원스레 그 가슴속 말들을 쏟아낼 수 없었던 것 같다. 연암은 끝끝내 자신의 문체를 버리지 않고 버텼지만, 그런 연유로 그의 저서인 『연암집』은 그가 죽은 지 100년 후가 되어서야 공식적인 출간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때는 1900년으로 대한제국이 막을 내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열하일기』 중에는 청국의 사람들과 필담을 나누는 도중 어떤 종이는 먹히거나 불태워지는 상황이 종종 나온다. 당시에는 망국과 건국 사이에 놓인 여러 사회적 이슈로, 암묵적으로 소통이 금기시된 주제와 표현이 있었다. 문자만을 보더라도 가령 日자와 月자등을 나란히 쓰는 것은 명 明을 떠올리게 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그리고 체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의 대화는 일찍이 청인들로부터 거절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이야기 봇짐이 가득했던 연암은 그곳에서 풍부한 주제로 유쾌한 입담을 가감 없이 표출한다. 어쩌면 조선인보다 꽉 막히지 않은 청인들의 앞이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기하학에 관한 대화가 담긴 「곡정필담」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포복절도할 내용이 담겼다고 여겨 신이나 옮겨 적은 「호질」, 젊은 시절 ‘윤영’이라 기억하는 기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적은 「허생전」 등은 그가 여행기와 함께 수록된 주옥같은 기록이다. 또한 그가 얼마나 탁월한 관찰자인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 「곡정필담」에서 ‘지동설’이 바로 연상되는 그의 발상이 그중 하나이다. 자신은 그저 상상이라고 하였지만 머릿속에서 구상했던 장면을 마치 바라본 듯 생생한 문장으로 매끄럽게 설명하였는데, 자신이 관찰한 사물과 자연의 여러 현상을 연결하며 구체적인 현상으로 끌어내는 대목에선 소위 말하는 천재는 이런 사람이 아닐지 여겨졌다. 그리고 연암은 봉황산을 지나며 안시성의 터가 실은 그 부근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후에 여러 학자에 의해 현장에서 고증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모이며 그가 옳았음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그는 늦은 나이에 학문을 시작하며 사기 史記를 공부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열하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북경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전에 글로만 보았던 과거의 옛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꿈같은 일이었을까?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찬 청나라의 모습은 조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투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사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들 이었다. 빈약한 울타리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연암도 가난 속에서 비슷한 시선의 높이로 바라볼 수 있었다. 실학은 조선의 양반들이 꺼리는 천한 일이었지만 청나라에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실생활의 방법 그 자체였다. 고상한 문장에 전념하느라 군자의 흐트러짐을 허용치 않았던 조선 사대부들은 비리와 탐욕에는 관대하였다. 이는 훗날 고단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농민들이 봉기하여 난을 일으키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데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지자, 조선 황실은 민심을 힘으로 제압하려다 힘에 부쳐 청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 일은 결국 조선이 망국으로 가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백성이 어리석어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나라가 근본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본심은 문자에 숨어 지내느라 그 속에 갇혀 기이하게 성장하였는데 마치 그 모습은 한족 여성이 지고지순하게 지킨 전족한 발 모양새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걷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발이지만 그 고상한 체통과 품위는 지켜냈으니 말이다. 연암 박지원은 내부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져버린 명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훗날 그 비슷한 길을 걷고 있던 조선에 불어닥칠 암울한 미래를 예견했을 것이다.
“무언가 탯덩이처럼 가슴속에 쌓여 통 내려가질 않는답니다.”_[본문 320쪽]
청인 ‘왕민호’가 연암에게 한 말이다. 이는 자신이 가진 ‘독특한 견해’가 외부로 전달될 때 두려움이 생길 것이 염려되어 드러내지 못한 채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는 심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연암을 두고도 하는 말 같기도 하였다. 연암이 젊은 시절 만났던 ‘윤영’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은 ‘신색’이라며 반박하며 우겼고, 또 어느 날 들려온 ‘삿갓 이생원’이란 자의 용태가 다시 ‘윤영’이란 자와 흡사하다는 것을 적은 글이 있다. 그렇다면 그가 실은 ‘허생’ 자신이었고 정체가 불분명한 아무개가 되어서라도 하고 싶었던 말을 이야기처럼 만들어 세상에 던져 놓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짐작게 하기도 한다. 훗날 『양반전』을 집필한 것도 ‘풍자’를 사용하여 전염성이 빠른 웃음과 함께 당시 조선 사회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퍼트리고 싶었던 것이지 않았을까?
2024년 6월 17일 甲寅일 _날씨 : 덥고 뜨거움
글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 마무리 글을 쓸 수 있음에 마음이 기쁘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열하일기』는 그 속에 담긴 기록들은 파헤치면 헤칠수록 계속해서 풀려나가는 두루마리 같아 마치 그 길 자체로 느껴질 정도여서 마침표 자리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책에 남긴 부표 사이를 다시 헤엄치다 건진 주옥같은 내용을 소재 삼아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눈 뒤 어설픈 글솜씨로 필자의 보잘것없는 생각을 실어 보았다. 다시 책을 펼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기에 이젠 이쯤에서 마지막 점을 찍으려고 한다. 이 여독이 풀리지 않기를!
- 이전글[새문장2기] 자유가 애민으로 승화된 여정(열하일기_연암박지원) 24.06.20
- 다음글[새문장2기] 신은 땅을 딛고, 둥근 것은 구른다(열하일기_연암박지원)_1 24.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