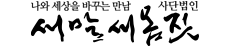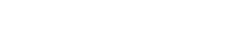경계, 비밀스러운 탄성 나는 경계에 있을 때만 오롯이 ‘나’다. 경계에 서지 않는 한, 한쪽의 수호자일 뿐이다. 정해진 틀을 지키는 문지기 개다. 경계에 서야 비로소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다. 변화는 경계의 연속적 중첩이기 때문이다. ‘진짜 나(眞我)’는 상(相)에 짓눌리지 않는 존재다. 이러면 부처가 되는 필요조건은 일단 채워진다. 동네 부처라도 될 요량이면 경계의 흐름 속으로 비집고 스며들어야 한다. 경계에 서 있으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로 몸이 기운다.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지 마라. 내가 그저 한쪽을 지키는 성실한 투사임을 한탄해라. 경계에 서 있는 상태를 자유롭고 독립적이라고 한다.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만 창의적이고 혁명적이다. 거기서 모든 위대함이 자란다. 하지만, 경계는 안타깝게도 비밀스럽다. 절대자유와 한계 지우지 못하는 큰 경지를 장자는 ‘대붕(大鵬)’으로 묘사한다. 대붕은 원래 작은 물고기였다. 길고 투철한 학습의 공력(積厚之功)이 극한까지 커져서 질적이 전환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던 찰나에 수양의 터전인 우주의 바다에 동요가 일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9만 리를 튀어 올라 새가 되었다. 이것이 ‘대붕’이다. 한쪽을 붙잡은 채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경계에 흘러야 주체는 튀어 오르는 탄성을 가질 수 있다. 탄성은 경계의 자손이자 위대함을 격발하는 방아쇠다. 대붕은 9만 리를 튀어 오르는 내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최진석, 『경계에 흐르다』, 소나무, 2017, 8~9쪽(서문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