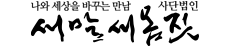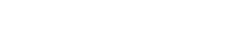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이 짧은 인생에 한 순간이라도 별처럼 살다 갈 수가 있다”
저는 당나라 초엽의 장자소를 연구했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지만, 또 장자라는 작품 전체에서 보여주는 장자의 스케일과 그 다음에 미학적 승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를 깊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장자라는 철학자가 내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장자가 쓴 장자라는 책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게 된 장자의 동기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가지고 장자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거기서 혹시 이것 때문에 장자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넓고 두터운 사상 체계를 건립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장자』 「지북유」편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인생천지지간(人生天地之間),한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약백구지과극(若白駒之過隙)” 백구(白駒)라고 하는 것은 천리마의 별칭입니다. 백구라고 하는 천리마가 있어요. 한번 발돋움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멀리 가는 말입니다. 백구지(白駒之)의 지(之)는 무엇이 무엇무엇 한다고 할 때 붙이는 말이죠. 과(過)는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극(隙)은 아주아주 좁은 틈새를 극이라고 합니다. 그 책받침 두께도 안 될 정도의 얇은 틈새를 극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인생천지지간 약백구지과극(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隙)”
“한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천리마가 책받침 두께도 안 되는 그 얇은 틈새를 휙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 뒤에 이런 말이 따릅니다. “홀연이이(忽然而已), 홀연할 따름이다.” 매우 짧다는 말이죠. 짧다는 말로도 그 짧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짧음입니다. 책받침 두께 정도도 안 되는 그 얇은 틈새를 천리마가 휙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홀연하다. 생명, 삶에 대한 장자의 이런 인식이 장자로 하여금 그렇게 두껍게 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을 구축하게 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혹은 이것으로부터 촉발 되어서 장자는 생각을 시작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이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맞고 안 맞고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장자를 구축하는 한 과정일 수도 있죠. 어쨌든 저는 장자 철학 혹은 장자 사상이 건립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 한 장을 발견 한 것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TV방송인데, 남자들 몇이서 밥 해 먹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남자들 몇이서 밥을 해 먹는데 그날 어떤 여성이 게스트로 초대되어 왔어요. 저녁밥을 다 먹고 그 여성이 평상에 드러누웠어요. 그 촬영 장소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에 드러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밝게 반짝반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야 그 별이 너무나 밝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남성들도 와서 그 별이 빛나는 것을 감상하겠죠. 근데 남성들이 여성에게 그 반짝이는 별을 더 잘 감상하게 해주고 싶어서 방송용 조명도 다 꺼주고 방 안에 있는 형광등 불빛도 다 꺼줍니다. 얼마나 수선스러운 일입니까. 그 수선스러운 일들을 다 해 가면서 불을 다 꺼줍니다. 그래서 그 섬에 불빛 하나도 없이 아주 칠흑 같은 밤이 되죠. 그 칠흑 같은 밤에 하늘에 걸려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네 명의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래도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밖에 걸려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방안에 있는 형광등 불도 끄고 방송국 조명도 다 꺼 가면서 저렇게 수선스러운 절차들을 다 밟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서 그 별을 보고 감탄하는데 밖에 있는 별, 밖에 걸려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수고를 다 하면서도 아무 수고도 들어가지 않을 ‘자기 안에 무슨“별”이 있는지, 자기는 무슨 “별”을 품고 있는지, 또 자기는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구나, 눈길 한 번 주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밖에 있는 별 반짝이는 것 감탄하고, 자기한테 있는 별 그리고 자기가 무슨 별 인지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는 책받침 두께도 안 되는 그 얇은 틈새를 천리마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짧고도 짧은 인생에서 자기는 한 번도 한 순간도 별처럼 살지 못하고 간다. 이래도 되겠는가하는 것입니다.자기가 별이 아닌데 밖에 있는 별이 아무리 반짝인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밖에 있는 별 감탄하다가 자기는 한 번도 별처럼 살지 못하는 이 형편없는 길을 우리가 왜 가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하라, 생각하라, 불편함을 느껴라, 문제를 발견하라, 자신을 궁금해 하라, 자신을 향해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야 주인으로 산다.’ ‘그래야 노예가 되지 않는다’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야 ‘이 짧은 인생에 한 순간이라도 별처럼 살다 갈 수 있다.’ '별처럼 사는 것이 무슨 일인지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밖에 걸려 있는 별을 감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내가 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과거에 갇혀서 진영에 갇혀서 자기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단 한 순간이라도 별처럼 사는 일을 경험해 볼 가치 정도는 있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