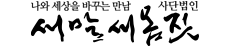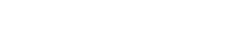문명과 전쟁을 읽는 중에
페이지 정보

본문
문명과 전쟁을 읽는 중에
이 책은 국가에 대한 나의 여러 가지 관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나? 아자 가트는 국가의 기원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다. 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우리가 국가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문자가 널리 사용된 후에 국가는 탄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국가가 문자의 활용도 높힌 셈이다. 결국 인간이 여러 동기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 싸움 속에서 부족들이 연합하며 국가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뿐이다.
그러면 부족이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아자 가트는 국가 형성의 핵심으로 '강제성'을 꼽지만, 강제성만으로는 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강제성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부족에서 국가로 발전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강제성은 주로 전쟁, 폭력, 지배로 발현된다。그러나 강제성은 소수가 다수 지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이기도 하다. 국가의 또 다른 요소인 합리적 체계는 정치와 법으로 발현된다. 국가는 물리적 억압을 시작으로 법과 정치를 통해 합리적인 강제력이 되면서 더욱 강력해 졌다.
강제성은 나쁜것인가 좋은것인가? 말하기 어렵다. 강제성은 주로 전쟁을 통해 드러나지만, 법과 정치 속에서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긍정적 힘이 되기도 한다. 결국 강제성의 앞면은 전쟁이고 뒷면은 법과 정치이다. 강제성의 기원은 폭력이지만, 그 동기는 결국 인간의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상승 욕구에서 비롯되며 인간을 앞으로 이끈다. 이 힘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쟁으로 드러나는 강제성은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띠기도 한다. 특히 프로이드의 죽음 충동처럼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 전쟁에서 총을 쏘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알은 둥근 지구를 돌아 나에게 돌아온다. 유럽의 전쟁은 더 이상 유럽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쟁은 자기 죽음 충동이며, 핵무기처럼 임계점을 넘으면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강제성은 주로 전쟁으로 밖에 발현되지 못하는걸까? 비폭력 강제성은 없는것일까? 인간은 결국 모라자면 뺏기밖에 못하는 종인건가? 옆에 사람이 못하면 가르쳐 주고 나누어 줄수는 없을까? 강제성을 법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걸까?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전쟁으로 발현되는 이 강제성으로 전쟁을 막고 영원한 평화를 논했던 철학자가 있었다. 바로 칸트이다. 언제나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회를 꿈꾸는 칸트다운 생각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칸트는 강제성을 법의 조건으로 요청하며 합리적 법 법칙을 주장하며 <법론>을 썼다。그리고 사법에서 공법 국제법으로 이어지며 특히, 국제법은 전쟁을 해야 할 권리, 세계시민법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 권리이다. 결국 우리는 전쟁을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때 전쟁을 해야 하고 어느 때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것인가? 아주 매우 어렵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다。 읽으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겠다。ㅎ
- 이전글승마 25.07.10
- 다음글기본학교 6기 지원 홍보영상 25.07.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