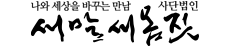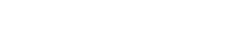음흉 음침 기괴 섬뜩 음산한 새벽 산책
페이지 정보

본문
늦은 밤에 문을 나서, 차분한 고요 속에서 우리 동네를 둘러본다. 2분 정도 걸었을 때 만날 수 있는 작은 사거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거리는 밤 12시가 지나면 신호등은 붉은색 점멸등으로 전환된다. 그 불빛은 마치 교차로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이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붉은 점멸등은 정지선 앞에 멈추었다가 지나가라는 신호다. 그런데 가끔, 붉은 점멸등 앞에 멈춰서 있는 차를 만날 때가 있다. 혹시 차 안에서 졸고 있는 것은 아닐까? ㄴ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자동차를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 그제야 차는 천천히 움직인다. 고맙지? 다음번에 만나면 빵이라도 쏴라.
빠른 걸음으로 10초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그리고 다리를 지나면 조그만 광장이 나온다. 그리고 광장과 광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공원을 지날 때면 곰처럼 거대한 강아지, 늑대처럼 몽환적인 강아지를 만날 때가 있다. 아마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서워 할 것이라 생각하여 늦은 새벽에만 산책을 다니는 듯하다. 광장은 겨울을 맞아 조그마한 썰매장을 준비하는 듯하다. 이곳은 여름이면 조그마한 수영장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내가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지. 썰매장이 다 만들어지면, 광장 앞 그리고 다리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아이들을 썰매를 끌고 다니겠지. 그렇게 아이들은 집, 아파트 단지, 학원, 피시방에서 벗어나 드 넓은 광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좋은 이유는 또 있다. 나는 1년에 많아야 주말에 한 두번 정도 PC방을 간다. PC방에서 1시간 이용권을 결제했지만 볼 일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끝나버린다. 나는 피시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까워, 주변 게임을 구경하던 초등학생을 붙잡아 내 자리에 앉히고 나는 집으로 향한다. 나 같은 이웃이 있는 동네. 참 좋은 곳이지. 초딩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제육볶음이라도 쏴라.
늦은 밤 산책을 즐기는 이유는 단순하다. 동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산책하면 거리의 진정한 밝음과 음산함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언제나 환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이 마치 축구 경기장의 조명처럼 밝아서, 새벽 3시에 횡단보도에서 50원짜리 동전을 떨어트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이곳이라면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온 고3 수험생도 공부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멀어질 수록 동네는 점점 음산해진다. 우리 동네만 그런가?
가끔 차를 타고 먼 도서관을 들렀다가 빵집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인보호구역을 지나칠 때가 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전혀 다르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늦은 저녁 임에도 새벽의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어둡고 음산하다. 횡단보도를 비추는 환한 조명도 없고, LED 가로등이 아닌 과거에 사용되었던 고압 나트륨 전구가 거리를 힘겹게 밝히고 있을 정도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자신의 무지에 새삼 놀라워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은 아이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에너지를 발산하듯,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익숙함에 젖어버린 듯, 변화하지 않고 멈춰 서 있다. 과거 매주 함평을 방문할 때마다 동네를 둘러보던 기억이 떠오른다. 함평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이다. 그곳은 고령층이 많으니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녹아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내가 살핀 곳은 노인을 배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사가 급한 언덕부터, 차도와 인도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곳을 자주 만났기 때문이다.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함평은 전주 한옥마을, 서울 북촌한옥마을처럼 연륜이 쌓인 성숙함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곳은 공간이 오랫동안 살아 숨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동네의 쾌적함이 소모되면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크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동네의 쾌적함을 충분히 소모한 다음 새로운 쾌적함을 소모하기 위해 신도시로 떠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쾌적함이 소모된 동네에 그대로 남아 폐허의 그림자 곁에 살아간다. 물론 재개발을 통해 다시 젊어지는 동네도 있지만.
지방 소도시는 소멸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로 아이와 청년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소도시 부흥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쾌적함을 소모하는 방향으로만 도시를 계획한다면, 다들 시간이 지나면 신도시로 떠날 것이다. 아주 짧게 생각해봤는데, 이제 지방 소도시는 단순 쾌적함을 소모하는 방향이 아닌, 점점 성숙시켜 연륜이 쌓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영국의 코츠월드, 프랑스의 프로방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일본의 시라카와고처럼 말이다.
그러고보니 서울의 전통시장 몇몇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쪽 거리는 얼마나 밝은지 본 적이 없다. 언제 시간이 된다면 한 번 가봐야지.
- 이전글"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답하려면, 24.12.21
- 다음글일기 24.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