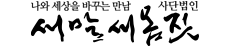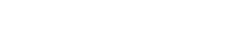몰려다니지 않는 예술가
페이지 정보

본문
며칠 전 최진석 교수님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다.
"예술가는 몰려다니지 않는다. 예술적인 높이의 삶도 그러하다."
내 이름은 박예솔이고 그냥 예쁜 소나무라는 뜻이다.
그런데 예술가는 뭐길래 몰려다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술적인 높이의 삶은 뭐길래 그러할까?
그래서 짧게 생각해봤다
몰려다니지 않는 예술가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렬히 추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닐까?
과거 예술은 정치 이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과거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체제에서의 예술은 목적을 위하여 선별되었다. 과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의 미술 작품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도 정치적인 색채를 띄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민국과 북조선이 통일을 한다면, 과거 통일되었을 때의 독일과 비슷한 풍경이 그려지지 않을까.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의 예술은 목적을 위하여 선별되었다면, 자본주의에서의 예술은 상업적 도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예술은 끊임없이 선별되고 있다. 이처럼 예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다면 예술 또한 이에 맞춰 선별되어 변화하지 않을까.
하지만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몰려다니지 않는 예술가'는 조금 다르다.
'몰려다니지 않는 예술가'란 현실 세계와 항상 대립하고 있었고 몰려다니게 만드는 특정 정치 체제, 이념에 적응하거나 바뀌지 않았다. 예술은 비정상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란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다. 두 작품은 이원화를 기반으로 시대와 대립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시대와의 대립, 갈등 속에서 조화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만들어낸다.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을 들여다보면, 최진석 교수님의 "예술가는 몰려다니지 않는다." 란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적인 높이의 삶'은 무엇일까? 난 이 답이 오스카 와일드의 <거짓의 쇠락>에 있다고 본다. 아래는 <거짓의 쇠락>에서 예술적인 높이의 삶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문장이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다. 자연은 우리를 만든 창조물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연은 비로소 생명에 눈을 뜬다. 사물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예술에 의해 좌우된다."
바라보는 대상과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예술 작품이 탄생하려면, 여러 사람들과 몰려다니며 같은 곳만 바라보거나, 같은 대상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예술작품은 공작품처럼 대중성의 색깔을 품고 있는 편의성과 유용성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동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거짓의 쇠락에서 말한 예술을 바탕으로 '예술적인 높이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다른 존재 그리고 이미지와 언어 등 인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릴 줄 아는 것이다. 새롭게 정의된 것을 통해 특수한 관계를 체험했을 때 통상적으로 맺고 있던 관계에 균열 또는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예술에 의하여 세계가 변화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세계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대해 품은 수많은 이미지의 총합이다. 이런 경험들은 제각기 주체와 현실 간의 관계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세계는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선행되어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세계는 내 시선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래서일까?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예술가를 '현상(現像)하는 자'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무엇을 겨냥하고 현상하는가? 어쩌면 미처 감각, 의식하지 못한 것들을 자연과 정신, 우리 외부 또는 내부에서 보여주는 것일까? 어쩌면 예술가가 현상하고자 향하는 곳은 인류의 보편적 관점이 되거나, 미래에 보편적 관점으로 간주될 특정 세계관의 기원일지도 모른다. 이 기원을 향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예술적 높이의 삶이 아닐까.
그렇다면 예술적인 높이의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 굳이 꼽자면 풍경화의 대가인 프랑스의 화가, 장바티스트 카미유 코로가 아닐까?
그는 당시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미치 인식하지 못한 면모를 발굴해낸 예술가라 할 수 있다. 그는 살롱전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풍경화만 고집했다. 그러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는 50세 즈음이었다. 그는 여러 예술가와 교류를 하기도 했지만, 이를 몰려다녔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와중에도 풍경화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시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몰려다니지 않는 예술가', '예술적인 높이의 삶'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유다.
장 바티스트 코로는 몰려다니지 않는 예술가이가이자, 예술적 높이의 삶을 산 사람이지만, 그의 시선은 사랑과 따수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룩하고 나서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거금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술가라고 하면, 세상과 동 떨어진 존재 같다. 하지만 최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술적인 높이의 삶을 사는 몰려다니지 않는 예술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현상(現像)하고 있던 무언가를 보면 그렇다.
아니면 말고~~~~~~
추천2 비추천0
- 이전글고산봉한테 박살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8.14
- 다음글팩맨 23.08.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